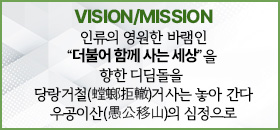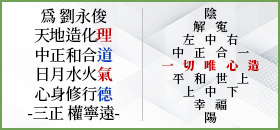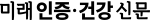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자에 대한 평가

8.1. 국내
유학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래로, 공자는 맹자와 더불어 공맹으로 불리며 유교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집에 들어와선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공자의 취지이다. "면서 한국의 '풍류'라는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 이미 공자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의 인(仁)사상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말했던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의 정신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예로부터 한국인의 정서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다. 삼국유사가 거꾸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이 불교에 충실했던 일연 스님임을 생각해 볼 때, 홍익인간은 공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정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되며, 한국사회에 유교가 잘 정착했던 것은 '한국에 있던 내재적인 정신 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공자의 유교문화 - 인(仁)사상'이 일치하는 면이 있어 받아들이기 쉬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무튼 공자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 수많은 유학자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에 등용되어 학문을 펼쳤으니, 한국에서의 그 위상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자의 사상은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지고 있다. 유교적 불교, 유교적 기독교, 유교적 자본주의 등으로 변형되어 한국사회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이러한 유교화된 사상들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공자의 인(仁)사상은 '친족 중심에서 그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엘리트 사회 구성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는 공자 사상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반감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와 센세이션한 흥행을 하기도 하였다.
공자의 경(敬)사상 역시, 조선 후기 신분질서를 강화하고자 변질되었던 성리학이 일제강점기, 군사정권때 까지 이어져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다면 깍듯이 높임말을 쓰는 상명하복의 예절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지만 공자는 공자 자신의 나이보다 많거나 비슷한 또래의 제자들이 있었다. 오늘날 같이 한살 차이에도 민감하게 순서를 매겨서 윗사람의 말에 강제적으로 존대말을 요구하는 이러한 문화는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군대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변형된 유교문화의 잔재라고 봐야 한다.
현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공자의 사상 중 일부가 현대 법치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논어》에서 공자가 "오직 여자[35]와 소인은 다루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겸손하지 않고, 멀리 하면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한 부분과, 《공자가어》의 '삼종지도와 칠거지악' 부분 등은 여자를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삼종지도는 어려서는 아버지와 남자 형제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삼종에서 종(從)은 '쫓아가서 모신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시대적 한계가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칠거지악은 칠출(七出)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경우이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오불취(五不取)도 있어서, 칠출에서 여자의 나쁜 점을 열거하고 오불취에서 남자의 나쁜 점을 열거하므로, 최근에는 칠거지악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다. 유교의 나쁜 점을 말하는데 있어서, 삼종지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